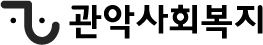소라넷 82.kissjav.icu ネ 무료야동사이트ゴ 소라넷 트위터ブ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위살림우 작성일25-10-28 04:07 조회21회 댓글0건관련링크
-
 http://15.kissjav.blog
17회 연결
http://15.kissjav.blog
17회 연결
-
 http://11.kissjav.click
17회 연결
http://11.kissjav.click
17회 연결
본문
소라넷 5.yadongkorea.me ヰ 소라넷 링크ヶ 소라넷 최신주소ギ 소라넷ワ 무료야동ヮ 야동사이트ナ 소라넷 같은 사이트ノ 소라넷 링크ジ 소라넷 트위터ノ 소라넷 링크ヮ 무료야동사이트ジ 소라넷 같은 사이트モ 소라넷 막힘チ 소라넷 우회ン 소라넷 검증ロ 소라넷 사이트ァ 소라넷 같은 사이트ニ 무료야동ォ 소라넷 같은 사이트ク 소라넷 사이트ド 소라넷 막힘ワ 소라넷 막힘ハ
일본의 착취 ‘혁신적 이동’… 한반도 철길 근간된 ‘망국의 모순’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
오늘날 철도는 지역 발전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특히 경기·인천처럼 연일 이동 수요가 많은 지역에선 빠르고 편리한 교통 인프라가 절실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철도는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너도나도 우리 동네에 전철역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나서고, 신규 철도 개설 계획이 매번 수도 없이 추진되는 것은 이런 점과 유망주식종목
맞물려있다.
1899년 경인선 개통 마차 12시간 → 90분 단축
대한제국 ‘부설권 외국인 불허’ 원칙 불구
일제 경의선·경원선 군용 개설 일방 발표
1905년·1914년 완공 경부선 연계 남북연결
의왕 철도박물관, 운행증권분석사이트
허가증 ‘통표’ 흔적
■ 경기도에 처음으로 열린 철도의 시간
한반도에 처음으로 철도가 깔린 것은 1899년이다. 1879년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 이후 조선은 1883년 제물포를 개항했다. 이 때 들어온 각종 물자를 서울까지 수송할 수단이 필요했다. 미국의 기업체리마스터 비법
가인 제임스 모스가 고종과 철도 창설 조약을 체결, 제물포(인천)와 서울 노량진 간 철도 개설권을 획득했다. 이후 일본 경인철도합자회사로 양도돼 1899년 경인선이 개통했다. 총 길이 33.2㎞. 인천에서 출발해 소사(부천)를 거쳐 노량진까지 닿았다. 지금의 경기도에도 경인선 개통으로 처음으로 철도의 시간이 시작됐다. 마차로는 12시간이 걸리던 거리를 증기캔들차트보는법
기관차로는 단 1시간30분만에 갈 수 있게 됐다. 이동의 혁신이었다.
인천과 서울을 잇는 경인선이 1899년 개통한 이후, 곧바로 동해 쪽 항구인 함경도 원산과 서울을 연결하는 철도의 필요성이 부상했다. 철도 부설권을 획득하기 위한 열강들의 경쟁이 치열했지만, 당시 대한제국은 ‘철도와 광산 경영은 외국인에게 불허한다’는 원칙을 세워 부설권야마토게임방법
을 국내 철도 회사에 부여했다. 이후 자체 조직으로 서북철도국을 설치하며 철도는 우리 스스로 개설한다는 방침을 더욱 공고히 했다. 그러나 일본의 간섭은 이런 대한제국의 의지를 비교적 쉽게 무너뜨렸다. 러·일 전쟁 시기, 전쟁에 활용하기 위해 일본 측에서 평안북도 신의주 쪽으로 닿는 철도가 필요해진 점도 한몫을 했다. 이는 경원선, 그리고 경의선을 군용 철도로 개설하겠다는 일제의 일방적 발표로 이어졌다.
경원선은 서울 용산에서 의정부를 거쳐 철원, 안변, 원산에 이르는, 한반도 동서를 잇는 철도로 총 길이만 무려 223.7㎞였다. 1914년 9월 개통했다. 지형 특성상 공사가 쉽지 않았던데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일제 수탈의 상징처럼 여겼던 철도 공사 현장을 기습하는 의병들이 적지 않았다. 길게는 1주일씩 험준한 산을 넘어 가야했던 북한 함경도까지의 이동은 하루 정도면 닿을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이동의 혁신이었다. 그러나 1945년 광복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맞이한 남북 분단으로 경원선은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됐다. 지금도 의정부시 녹양역 뒤편엔 폐선된 경원선의 흔적이 남아있다.
경의선은 경원선보다 앞서 1905년 개통했다. 서울과 신의주를 무려 485.7㎞ 잇는 노선이었다. 마찬가지로 1905년 개통한 경부선과 서울에서 연계돼, 사실상 한반도 남북을 연결하는 주축을 담당했다. 경기도에선 고양, 파주 일대를 지났는데 경원선처럼 남북 분단 이후로 운행이 중단됐다.
경인선, 경의선, 경원선 등과도 연계됐던 경부선은 서울과 부산을 이으며, 그야말로 우리나라 경제 지도를 만든 노선이다. 경기도에선 경인선에서 분기돼 시흥부터 안양, 수원, 오산 일대로 이어져 충청지역으로 향했다. 수인선, 수여선 등과 더불어 수원 일대가 경기도 교통의 거점으로서 추후 경기도의 중심 도시로 거듭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2008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인선, 경의선, 경부선 철도 통표. 5점 모두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있다. /국가유산포털
현재 의왕시 소재 철도박물관에는 경인선, 경의선, 경부선 개통과 함께 사용하던 ‘통표’가 있다. 통표는 철도에서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역장과 기관사가 주고받던 일종의 열차 운행 허가증이다. 한 선로에 열차 한 대만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 설비를 도입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증표를 썼다. 이를 통해 그 시절 경인선, 경의선, 경부선 등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수인선 1937년 수원~안산~시흥~인천 52㎞
경기평야·소래염전서 인천항까지 물자 수송
협궤노선 1931년 수원~여주 수여선이 먼저
청년 징병수단 등서 광복후 여객열차 기능
수요 줄며 중단… 최근 옛 철로 보존 노력도
■ 산업화의 뿌리가 된 수탈의 상징
1937년 운행을 시작, 수원과 인천을 이었던 52.8㎞의 수인선 협궤열차. 1994년 3월 4일 소래철교를 지나고 있는 수인선 협궤열차. /경인일보DB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협궤열차의 추억으로 각인돼있는 수인선 역시 시작은 일제의 수탈이었다. 일본인 소유의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가 1935년부터 만들어, 1937년 7월 개통했다. 수원시에서 안산시, 시흥시를 지나 인천시까지 닿는 52㎞ 구간의 노선이었다. 경기도에서 생산된 쌀과 시흥, 소래포구 일대 염전에서 생산한 소금을 인천항까지 실어 일본으로 반출하는 게 해당 노선을 개설한 목적이었다. 여객 수송이 아닌, 물자 수송이 주 목적이었기에 762㎜의 협궤(좁은 궤간) 철도 노선으로 개설됐다. 오가는 열차 크기도 작았다.
1994년8월21일 수인선 협궤열차 안 승객들. 1937년 일제가 수탈한 쌀을 반출하기 위해 개통된 뒤 반세기 넘도록 인천 송도와 수원을 오간 ‘꼬마열차’는 1995년의 마지막 날, 운행을 멈추었다. /경인일보DB
광복을 맞은 1945년 이후엔 국유화돼 당초 목적이었던 화물 수송보다는 여객 열차로서의 기능이 부각됐다. 수원과 경기 서부지역, 인천을 오가는 서민들에겐 소중한 교통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염전에서 생산한 소금을 판매하려는 이들에겐 생계 수단이기도 했고, 소래포구를 수도권 곳곳에서 찾는 명소로 거듭나게 한 효자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 1988년 안산선이 개통하면서 노선 일부를 병행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과천선마저 운행을 시작하자 수요는 점점 줄게 됐다. 결국 1995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수인선 운행이 종료됐고 2005년까지 폐선된 채 방치됐다. 여전히 그 시절 수인선 구간 일부엔 협궤 노선의 흔적이 남아있다. 과거 수인선이 운행되던 시기를 기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지자체들도 있다.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2020년 숭의역에서부터 인하대역에 이는 1.5㎞ 구간에 ‘수인선 바람길숲’을 조성해, 옛 철로를 보존했다. 숭의역 1번 출구 인근에 협궤열차의 모습을 재현한 조형물도 설치했다. 인천 남동구도 소래역사관에 수인선 역사를 전시한 것은 물론, 역사관 앞 광장에 협궤열차 모형을 전시하고 있다.
협궤철도 노선이라고 하면 수인선을 많이 떠올리지만 그 이전에 수여선이 있었다. 이름 그대로 수원과 여주를 잇는 73.4㎞ 노선으로, 용인과 이천 등 경기남부를 지났다. 마찬가지로 여주·이천·용인 등지에서 생산하는 쌀 등 곡식과 각종 물자를 수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1931년 개설됐다. 이어 1937년 수인선이 개통하자 해당 노선과 이어져 인천을 통해 일본으로 자원을 반출하는 주요 통로로 작용했다. 때로는 지역 청년들을 징병하는 수단으로도 쓰였다.
수인선처럼 수여선도 1945년 광복 이후엔 여객 열차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다. 상인들은 여주, 이천, 용인 등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수여선에 올랐다. 그 덕분에 역을 중심으로 각 지역 시장이 발달했다. 학생들은 수여선을 이용해 용인, 수원 등까지 통학하기도 했다. 1960년대 이후 도로가 발달하고 차량을 이용한 여객·화물 수송이 증가하자 수여선 수요도 점차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1972년 3월 31일자로 운행이 중단됐다. 수여선이 있던 곳은 대부분 재개발돼 그나마 다른 철도 노선들과 달리 옛 흔적 역시 찾기가 어려운 편이다. 그럼에도 수여선을 잊지 않기 위한 경기도 등 지자체들의 노력이 지속되는 추세다. 경기도가 용인시청에서 양지까지 ‘수여선 옛길’을 조성한 게 대표적이다.
그 시절 철도는 나라를 잃은 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 아픈 역사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수도권 교통의 뿌리가 되고 산업화의 근간이 돼 지역 발전을 이끄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독자 퀴즈 이벤트]
‘항일의 기억 광복의 기쁨’을 애독해주시는 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정답을 맞히신 분들 중 20분을 추첨해, 소정의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는 11월 2일까지입니다. 정답은 11월 4일자 지면 등에 공개됩니다)
Q. 일제가 ‘색복 장려 운동’을 통해 막고자 했던 것은 어떤 것입니까?
QR코드를 통해 퀴즈에 참여해주세요
/강기정 기자 kanggj@kyeongin.com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
오늘날 철도는 지역 발전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특히 경기·인천처럼 연일 이동 수요가 많은 지역에선 빠르고 편리한 교통 인프라가 절실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철도는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너도나도 우리 동네에 전철역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나서고, 신규 철도 개설 계획이 매번 수도 없이 추진되는 것은 이런 점과 유망주식종목
맞물려있다.
1899년 경인선 개통 마차 12시간 → 90분 단축
대한제국 ‘부설권 외국인 불허’ 원칙 불구
일제 경의선·경원선 군용 개설 일방 발표
1905년·1914년 완공 경부선 연계 남북연결
의왕 철도박물관, 운행증권분석사이트
허가증 ‘통표’ 흔적
■ 경기도에 처음으로 열린 철도의 시간
한반도에 처음으로 철도가 깔린 것은 1899년이다. 1879년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 이후 조선은 1883년 제물포를 개항했다. 이 때 들어온 각종 물자를 서울까지 수송할 수단이 필요했다. 미국의 기업체리마스터 비법
가인 제임스 모스가 고종과 철도 창설 조약을 체결, 제물포(인천)와 서울 노량진 간 철도 개설권을 획득했다. 이후 일본 경인철도합자회사로 양도돼 1899년 경인선이 개통했다. 총 길이 33.2㎞. 인천에서 출발해 소사(부천)를 거쳐 노량진까지 닿았다. 지금의 경기도에도 경인선 개통으로 처음으로 철도의 시간이 시작됐다. 마차로는 12시간이 걸리던 거리를 증기캔들차트보는법
기관차로는 단 1시간30분만에 갈 수 있게 됐다. 이동의 혁신이었다.
인천과 서울을 잇는 경인선이 1899년 개통한 이후, 곧바로 동해 쪽 항구인 함경도 원산과 서울을 연결하는 철도의 필요성이 부상했다. 철도 부설권을 획득하기 위한 열강들의 경쟁이 치열했지만, 당시 대한제국은 ‘철도와 광산 경영은 외국인에게 불허한다’는 원칙을 세워 부설권야마토게임방법
을 국내 철도 회사에 부여했다. 이후 자체 조직으로 서북철도국을 설치하며 철도는 우리 스스로 개설한다는 방침을 더욱 공고히 했다. 그러나 일본의 간섭은 이런 대한제국의 의지를 비교적 쉽게 무너뜨렸다. 러·일 전쟁 시기, 전쟁에 활용하기 위해 일본 측에서 평안북도 신의주 쪽으로 닿는 철도가 필요해진 점도 한몫을 했다. 이는 경원선, 그리고 경의선을 군용 철도로 개설하겠다는 일제의 일방적 발표로 이어졌다.
경원선은 서울 용산에서 의정부를 거쳐 철원, 안변, 원산에 이르는, 한반도 동서를 잇는 철도로 총 길이만 무려 223.7㎞였다. 1914년 9월 개통했다. 지형 특성상 공사가 쉽지 않았던데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일제 수탈의 상징처럼 여겼던 철도 공사 현장을 기습하는 의병들이 적지 않았다. 길게는 1주일씩 험준한 산을 넘어 가야했던 북한 함경도까지의 이동은 하루 정도면 닿을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이동의 혁신이었다. 그러나 1945년 광복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맞이한 남북 분단으로 경원선은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됐다. 지금도 의정부시 녹양역 뒤편엔 폐선된 경원선의 흔적이 남아있다.
경의선은 경원선보다 앞서 1905년 개통했다. 서울과 신의주를 무려 485.7㎞ 잇는 노선이었다. 마찬가지로 1905년 개통한 경부선과 서울에서 연계돼, 사실상 한반도 남북을 연결하는 주축을 담당했다. 경기도에선 고양, 파주 일대를 지났는데 경원선처럼 남북 분단 이후로 운행이 중단됐다.
경인선, 경의선, 경원선 등과도 연계됐던 경부선은 서울과 부산을 이으며, 그야말로 우리나라 경제 지도를 만든 노선이다. 경기도에선 경인선에서 분기돼 시흥부터 안양, 수원, 오산 일대로 이어져 충청지역으로 향했다. 수인선, 수여선 등과 더불어 수원 일대가 경기도 교통의 거점으로서 추후 경기도의 중심 도시로 거듭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2008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인선, 경의선, 경부선 철도 통표. 5점 모두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있다. /국가유산포털
현재 의왕시 소재 철도박물관에는 경인선, 경의선, 경부선 개통과 함께 사용하던 ‘통표’가 있다. 통표는 철도에서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역장과 기관사가 주고받던 일종의 열차 운행 허가증이다. 한 선로에 열차 한 대만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 설비를 도입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증표를 썼다. 이를 통해 그 시절 경인선, 경의선, 경부선 등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수인선 1937년 수원~안산~시흥~인천 52㎞
경기평야·소래염전서 인천항까지 물자 수송
협궤노선 1931년 수원~여주 수여선이 먼저
청년 징병수단 등서 광복후 여객열차 기능
수요 줄며 중단… 최근 옛 철로 보존 노력도
■ 산업화의 뿌리가 된 수탈의 상징
1937년 운행을 시작, 수원과 인천을 이었던 52.8㎞의 수인선 협궤열차. 1994년 3월 4일 소래철교를 지나고 있는 수인선 협궤열차. /경인일보DB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협궤열차의 추억으로 각인돼있는 수인선 역시 시작은 일제의 수탈이었다. 일본인 소유의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가 1935년부터 만들어, 1937년 7월 개통했다. 수원시에서 안산시, 시흥시를 지나 인천시까지 닿는 52㎞ 구간의 노선이었다. 경기도에서 생산된 쌀과 시흥, 소래포구 일대 염전에서 생산한 소금을 인천항까지 실어 일본으로 반출하는 게 해당 노선을 개설한 목적이었다. 여객 수송이 아닌, 물자 수송이 주 목적이었기에 762㎜의 협궤(좁은 궤간) 철도 노선으로 개설됐다. 오가는 열차 크기도 작았다.
1994년8월21일 수인선 협궤열차 안 승객들. 1937년 일제가 수탈한 쌀을 반출하기 위해 개통된 뒤 반세기 넘도록 인천 송도와 수원을 오간 ‘꼬마열차’는 1995년의 마지막 날, 운행을 멈추었다. /경인일보DB
광복을 맞은 1945년 이후엔 국유화돼 당초 목적이었던 화물 수송보다는 여객 열차로서의 기능이 부각됐다. 수원과 경기 서부지역, 인천을 오가는 서민들에겐 소중한 교통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염전에서 생산한 소금을 판매하려는 이들에겐 생계 수단이기도 했고, 소래포구를 수도권 곳곳에서 찾는 명소로 거듭나게 한 효자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 1988년 안산선이 개통하면서 노선 일부를 병행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과천선마저 운행을 시작하자 수요는 점점 줄게 됐다. 결국 1995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수인선 운행이 종료됐고 2005년까지 폐선된 채 방치됐다. 여전히 그 시절 수인선 구간 일부엔 협궤 노선의 흔적이 남아있다. 과거 수인선이 운행되던 시기를 기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지자체들도 있다.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2020년 숭의역에서부터 인하대역에 이는 1.5㎞ 구간에 ‘수인선 바람길숲’을 조성해, 옛 철로를 보존했다. 숭의역 1번 출구 인근에 협궤열차의 모습을 재현한 조형물도 설치했다. 인천 남동구도 소래역사관에 수인선 역사를 전시한 것은 물론, 역사관 앞 광장에 협궤열차 모형을 전시하고 있다.
협궤철도 노선이라고 하면 수인선을 많이 떠올리지만 그 이전에 수여선이 있었다. 이름 그대로 수원과 여주를 잇는 73.4㎞ 노선으로, 용인과 이천 등 경기남부를 지났다. 마찬가지로 여주·이천·용인 등지에서 생산하는 쌀 등 곡식과 각종 물자를 수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1931년 개설됐다. 이어 1937년 수인선이 개통하자 해당 노선과 이어져 인천을 통해 일본으로 자원을 반출하는 주요 통로로 작용했다. 때로는 지역 청년들을 징병하는 수단으로도 쓰였다.
수인선처럼 수여선도 1945년 광복 이후엔 여객 열차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다. 상인들은 여주, 이천, 용인 등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수여선에 올랐다. 그 덕분에 역을 중심으로 각 지역 시장이 발달했다. 학생들은 수여선을 이용해 용인, 수원 등까지 통학하기도 했다. 1960년대 이후 도로가 발달하고 차량을 이용한 여객·화물 수송이 증가하자 수여선 수요도 점차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1972년 3월 31일자로 운행이 중단됐다. 수여선이 있던 곳은 대부분 재개발돼 그나마 다른 철도 노선들과 달리 옛 흔적 역시 찾기가 어려운 편이다. 그럼에도 수여선을 잊지 않기 위한 경기도 등 지자체들의 노력이 지속되는 추세다. 경기도가 용인시청에서 양지까지 ‘수여선 옛길’을 조성한 게 대표적이다.
그 시절 철도는 나라를 잃은 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 아픈 역사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수도권 교통의 뿌리가 되고 산업화의 근간이 돼 지역 발전을 이끄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독자 퀴즈 이벤트]
‘항일의 기억 광복의 기쁨’을 애독해주시는 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정답을 맞히신 분들 중 20분을 추첨해, 소정의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는 11월 2일까지입니다. 정답은 11월 4일자 지면 등에 공개됩니다)
Q. 일제가 ‘색복 장려 운동’을 통해 막고자 했던 것은 어떤 것입니까?
QR코드를 통해 퀴즈에 참여해주세요
/강기정 기자 kanggj@kyeongin.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